 - 박차영 기자
- 승인 2022.04.10 09:22
장한철(張漢喆)은 1744년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에서 태어나 영조 재위시기인 1770년 12월 25일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서울로 가는 장삿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나 표류했다. 그가 탄 배는 류큐(琉球, 오키나와) 열도의 여러 섬 가운데 호산도(虎山島)라는 무인도에 표착했다. 해를 넘겨 1771년 1월 다행스럽게 근처를 지나던 베트남(安南) 상선을 만나 흑산도 앞바다에 이르렀으나, 다시 풍랑을 만나 청산도(靑山島)에 표착해 살아 남았다.
출처 : http://www.atla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71

항해 중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일어나는 표류(漂流)는 뜻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동과 새로운 문화 전파의 계기가 된다. 우리 조상들은 일찍부터 바다를 무대로 활발한 활동을 해왔고, 이에 비례하여 숱한 표류를 겪어야 했다. 표류의 발생과 역할 
표류는 불규칙한 해류(海流)와 조류(潮流), 태풍이나 돌풍, 폭우와 같은 기상 이변, 그리고 배의 파손, 내부 혼란, 해적의 습격 등 여러 이유로 발생한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표류를 당할 위험성을 무릅쓰고 생존을 위한 고기잡이와 장사, 국가의 공적 업무를 위한 사신 왕래, 배움을 위한 유학 등의 이유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
표류는 사람의 목숨을 잃게도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표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었고, 표류를 통해 얻게 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은 정체된 사회에 신선한 활력소가 되기도 했다. 삼국시대의 표류인 
우리 역사에서 표류와 관련된 기록은 삼국시대 초기까지 올라간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따르면 신라 건국시조의 한 사람인 석탈해(昔脫解, 재위: 57~80)는 본래 다파나국(多婆那國) 출신으로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려져 바다에 띄워졌다. 그는 표류 끝에 금관가야에 도착했다가 정착하지 못하고, 신라에 와서 왕이 된다.
탐라국의 건국신화에는 양을나(良乙那), 고을나(高乙那), 부을나(夫乙那) 세 명의 신인(神人)이 땅 속에서 나왔지만, 그들의 아내는 바다에서 표착(漂着- 물결에 떠돌아다니다가 일정한 곳에 정착함)한 사람들이었다. 표류해 온 사람들이 왕과 왕비가 되었듯이, 반대로 [삼국유사(三國遺事)]에 등장하는 신라인 연오랑(延烏郞)과 세오녀(細烏女)는 158년에 표류를 당해 왜국의 왕과 왕비가 되기도 했다. 표착한 사람은 매우 특별한 인물로 여겨지기도 했던 것이다. 사람뿐 아니라, 물자도 특별한 인연으로 표류를 해왔다고 여겨지기도 했다. [삼국유사]에는 인도 아육왕(阿育王)이 5만 7천근의 철과 황금 3만 푼을 모아 불상을 만들려다가 실패하자 그것을 배에 실어 바다로 띄우면서 인연이 있는 국토에 가서 장육존상을 이루어달라고 축원했는데, 그 배가 신라에 도착했기 때문에 황룡사(黃龍寺) 장육존상(丈六尊像)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하였다. 표류와 신앙 
[삼국유사]에는 9세기 말 홀로 섬에 표류해 서해 해신을 위해 나쁜 여우를 죽여, 해신의 딸을 부인으로 얻으며, 용을 타고 당나라에 가서 사신의 임무를 다하는 신라인 거타지(居陀知)의 모험담이 실려 있다. 표류는 옛 사람들에게 상상력을 부추겨 모험담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표류는 사람들에게 두려운 것이었다. 727년 발해의 사신단은 본래 목적지를 벗어나 일본의 북쪽인 데와 지방에 도착하여, 그곳의 원주민에 의해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기도 했다. 776년 발해 남해부에서 출발한 발해 사신단 187명은 일본의 가하에 도착하였으나, 이 항해에서 겨우 46명만이 살아남았다. 831년 당나라에서 돌아오던 신라 사신 능유 일행이 바다에 빠져 죽었다. 또 893년에도 신라 사신이 당나라로 가다가 바다에 빠져 죽었던 것처럼 항해를 하다 표류를 당해 죽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사람들은 표류 당하지 않기 위해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변산반도 끝에 위치한 죽막동(竹幕洞) 유적은 마한, 백제, 가야 사람들이 항해 시 안전과 무사귀환을 빌었던 제사터였다. 이곳은 통일신라, 고려, 조선시대 후기까지도 사람들이 제사를 지낸 곳이다. 안전한 항해를 바라는 마음은 시대가 흘러도 변하지 않았다. |
|

남해 보리암의 해수관음상(왼쪽)과 낙산사 해수관음상(오른쪽)은 모두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다. 관음보살은 바다의 안전을 지켜주는 해신으로 널리 숭배되었다.
<오른쪽 출처: (cc) Steve46814 at wikipedia.org> 사람들은 용왕(龍王), 관음보살(觀音菩薩),  영등할매 등 다양한 해신(海神)을 숭배했다. 1770~1771년에 표류를 당한 장한철(張漢喆, 1744~?)이 쓴 [표해록(漂海錄)]에는 고래를 만나 위험에 빠진 제주도 선원들이 열심히 관음보살을 부르며 염불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불교의 신앙대상 가운데 관음보살은 해신으로도 특별히 섬겨져 왔다. 우리나라 3대 관음성지인 남해 보리암, 서해 강화도 보문사, 동해 양양 낙산사의 해수관음보살상(海水觀音菩薩像)은 모두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다. 사람들은 바다가 주는 공포를 신앙을 통해 극복하고자 했던 것이다. 영등할매 등 다양한 해신(海神)을 숭배했다. 1770~1771년에 표류를 당한 장한철(張漢喆, 1744~?)이 쓴 [표해록(漂海錄)]에는 고래를 만나 위험에 빠진 제주도 선원들이 열심히 관음보살을 부르며 염불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불교의 신앙대상 가운데 관음보살은 해신으로도 특별히 섬겨져 왔다. 우리나라 3대 관음성지인 남해 보리암, 서해 강화도 보문사, 동해 양양 낙산사의 해수관음보살상(海水觀音菩薩像)은 모두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다. 사람들은 바다가 주는 공포를 신앙을 통해 극복하고자 했던 것이다. |
|
고려시대의 표류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청동 거울에 배를 타고 항해하는 모습이 새겨져 있다.
고려 전기까지만 해도 우리조상들은 동아시아 바다를 무대로 활발한 해상활동을 전개했었다. |
|
| 10~13세기 동아시아는 송-고려, 고려-일본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해상 무역이 활발하던 시기였다. 해상 교류가 잦다보니, 자연스럽게 표류하는 사람도 많아졌다. 당시 표류민 가운데는 송, 일본인보다 고려 사람들의 숫자가 월등히 많았다. 표류인이 많은 것은 그만큼 고려인의 해양 활동이 활발했기 때문이었다. 일본은 900~1176년 사이에 표류 기록이 없는데, 이는 일본인의 해상 활동이 위축된 시기와도 일치한다. 또 송나라의 경우는 사신들이 가장 많이 표류하고, 상인의 경우는 1건 정도뿐이었다. 고려는 거란과의 전쟁이 마무리된 1018년 이후부터 12세기에 이르기까지 대외무역이 활발했다. 이 시기에 표류민의 숫자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표류민은 상인의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사신(使臣), 승려, 어부 등이다. 고려 상인의 활동이 타국 상인에 비해 활발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
|
닫힌 조선에 새로운 정보를 가져온 최부 
고려시대 전기와 달리, 고려 말, 조선시대에는 우리 겨레의 해상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던 시대였다. 강대국인 명(明)나라가 해금(海禁)정책을 실시한 탓도 있지만, 조선 역시 섬을 비워두는 공도(空島)정책, 바다로 나가는 것을 금지하는 해금정책을 시행했던 시대였다. 이 시기 조선에 새로운 문화가 들어오는 통로는 육로를 통해 조선이 명나라에 정기적으로 보내는 사신 왕래가 거의 전부였다. 그런데 표류로 인해 새로운 정보가 조선에 전해지기도 했다. 1488년 최부(崔溥, 1454~1504)는 제주도에서 나주로 배를 타고 오다가 흑산도 부근에서 풍랑을 만나 표류하여 중국 절강성 임해현에 도착했다. 최부는 이곳에서 명나라 관리의 조사를 받은 후, 일행 43명과 함께 대운하를 거쳐 소주, 서주, 천진, 북경을 지나 요동을 경유하여 148일 만에 귀국할 수 있었다. 당시 조선 사람들이 북경까지 겨우 왕래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최부는 명나라에서 경제와 문화가 가장 발달한 양자강 남쪽(江南) 지방을 자세히 볼 수가 있었다. 그는 비록 표류한 사람이었지만, 조선의 농민을 위해 중국식 수차(水車)의 제작기술을 목공에게 직접 배워오기도 했다. 그가 귀국하자 성종(成宗, 재위: 1470~1494)은 최부가 표류하게 된 과정과 명나라의 사정을 알고 싶어 표류일기를 써서 제출하도록 명하였고, 최부는 [표해록(漂海錄)]을 완성해 성종에게 바쳤다. 최부는 성종의 명을 받아 수차를 제작하기도 했다. 새로운 외부 자극에 닫혀 있었던 당시의 조선에 최부의 경험과 지식은 새로운 자극이 되었으나, 그 효과는 길지 못했다. 도리어 최부의 [표해록]은 명나라에 사신조차 보내지 못해 중국 정보에 목마른 일본에서 번역되어 더욱 인기를 끌기도 했다. |
|
|  최부의 표류여행도. 흑산도 부근에서 풍랑을 만나 중국 절강성에 표착한 최부는 귀국할 때 바다로 돌아오지 못하고, 육로로 먼 길을 돌아와야 했다. 경제와 문화가 발달한 양자강 이남을 거쳐 온 일을 통해 최부는 당시 명나라를 제대로 알 수 있었다. |
|
유구국과 필리핀을 다녀온 문순득 
관리였던 최부와 달리 문순득(文淳得, 1777~?)은 전남 신안군 우이도에서 태어난 섬사람으로, 유구국(오키나와)와 여송(呂宋- 필리핀)에 표류하여 다녀온 인물이다. 문순득은 1801년 12월 대흑산도 남쪽에 있는 태사도에 홍어를 사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풍랑을 만나 일본 남쪽에 위치한 유구국의 대도(奄美大島, 아마미오시마)에 도착했다. 그는 그곳에서 약 8개월간 머물다가 배를 타고 돌아오고자 했는데, 이번에도 풍랑을 만나 유구국보다 더 남쪽인 일룸(필리핀 북부 루손섬의 일로코스 지방)이란 곳에 도착했다. 그는 여기서 9개월간 머물다가, 여송에서 중국으로 가는 상선을 타고 오늘날의 마카오에 도착했다. 그는 그곳에서 3개월간 머물며 마카오에 전파된 유럽의 문화를 경험하기도 했다. 이후 문순득은 마카오를 출발, 육로로 청나라 땅을 통과해 1805년 1월에야 고향에 돌아올 수 있었다.
|
|
 [표해시말]은 문순득의 경험담을 정약전이 대필하여 펴낸 책으로, 최부의 [표해록], 장한철의 [표해록]과 더불어 대표적인 표류작품의 꼽힌다. 국내 표류기 중 유일하게 스페인이 지배하던 필리핀과 포루투갈의 거류지였던 마카오에 관한 기록이 담겨있다. |  장한철의 [표해록]은 장한철이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서울로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 오키나와에 표착한 뒤 일본으로 가는 상선을 만나 구조되었을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쓰여진 책이다. 제주특별자치고 유형문화재 제 27호. 국립제주박물관 소장.
<출처: 문화재청 홈페이지> |
그가 우이도에 도착했을 때, 유명한 학자인 정약전(丁若銓, 1758∼1816)이 이곳에 유배(流配) 당해 와 있었다. 정약전은 문순득이 보고 들었던 체험담을 글로 남겨 [표해시말(漂海始末)]이란 책을 만들었다. 이 책에는 중국, 유구, 여송 지역의 풍속과 언어를 비롯하여 표류의 일정, 궁궐문화, 의복, 선박, 토산품, 기후 등이 체계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문순득은 마카오에서 본 화폐의 유용성에 대해서 이야기 했고, 이 소식은 정약전을 통해 정약용(丁若鏞, 1762~1836)에게까지 전해져, 그가 새로운 화폐 개혁안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약용의 제자인 이강회(李綱會)는 우의도까지 문순득을 찾아와, 그가 본 외국의 선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우리나라 최초로 선박 관련 글인 [운곡선설(雲谷船設)]을 쓰기도 했다. 필리핀어를 익힌 문순득은 1809년 제주도에 온 필리핀 사람들의 통역을 담당하기도 했다. 필리핀 사람들은 1801년에 제주도에 표착했는데, 말이 통하지 않아 돌려보내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문순득은 최초의 필리핀어 통역관이었던 셈이다. 또한 그의 표류 경험은 정약전, 정약용, 이강회 등 여러 학자들에게 세계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되어, 우리나라 학문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었다. 이는 표류가 가져다 준 선물이라고 하겠다.
표류인 하멜에 의해 조선이 유럽에 알려지다

동아시아 각국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서양인들도 조선에 표착했다. 1578년 포르투갈 배가 마카오에서 일본으로 가다가 조선에 표착한 것을 시작으로, 포르투갈, 영국인들이 조선에 온 바 있었다. 조선은 이들을 쫓아 버리거나 명나라로 보내 버렸다. 하지만 1627년 제주도에 도착한 네덜란드인 벨테브레 일행만큼은 훈련도감(訓練都監- 한양을 방어하는 군대)의 군사로 편입시켜 무기를 만드는 일을 담당케 했다. 오래 살아남은 벨테브레(Weltevree)는 박연(朴燕/朴淵, ?~?)이란 이름을 쓰면서 조선 여인과 결혼해 이 땅에 정착해 살았고, 홍이포(紅夷砲- 네덜란드 대포를 모방한 중국식 대포) 제조법과 조작법을 조선 사람들에게 지도하고 병자호란 때 직접 전투에 나서기도 했다.
1653년에는 제주도에 하멜(Hendrik Hamel, 1630~1692)을 비롯한 36명의 네덜란드 사람이 도착했다. 하멜 일행도 박연처럼 훈련도감에 배치시켰다. 하지만 이들을 이용해 군사력을 키우려는 것이 청나라에 알려질 것이 두려워, 조선은 이들을 전라도로 보냈다. 이곳에서 하멜 일행은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전락하여 힘겹게 살아야 했다. 그러다가 1666년 하멜이 동료 7명과 함께 일본으로 탈출하는데 성공했다. 13년간 조선에서 억류 생활을 한 하멜은 네덜란드로 돌아가 [하멜표류기]를 펴냈다. 표류인인 하멜의 책을 통해 유럽에 조선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표류는 흔한 일 
일본 측의 기록에 따르면 1599년부터 1872년까지 273년간 일본에 조선인이 표류한 것이 967건, 9,751명이나 된다. 일본인의 조선 표착 건수도 일본 측 기록으로 99건 정도가 된다. 1710~1884년까지 175년간 조선 선박이 중국에 표류한 건수는 172건으로 평균 1년에 한 건이 발생했다. 1661~1871년 사이에 조선 선박이 유구(琉球)에 표류한 건수는 31건이나 된다. 반면 1644~1885년까지 242년간 중국선박이 조선에 표착한 건수는 약 240건이나 된다. 이러한 통계는 기록된 것만 그러할 뿐으로, 기록되지 않은 것을 포함하면 실제로 표류된 건수는 더 많았을 것이다.
동아시아 각국은 일정한 구호 절차를 통해 표류민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었다. 정약용은 [해방고(海防考)]와 [표선문정(漂船問情)]이란 글을 통해 조선 정부의 표류선 처리에 관한 매뉴얼을 기록하기도 했다. 표류민 처리의 부작용 
1784년 무과에 급제한 이방익(李邦翼, 1756~?)은 1796년 서울에 있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제주에서 배를 탔다가 청나라에 표류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이광빈도 젊은 날 무과 시험을 보기 위해 바다를 건너다가 표류를 당한 적이 있었다.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이 표류를 당한 것이다. 이렇듯 표류가 잦은 가운데, 상습적으로 표류를 위장한 사람도 있었다.
제주 출신의 고한록(高閑祿)은 1827년, 1833년, 1836년, 1837년 4차례에 걸쳐 청나라에 표착한 바 있다. 그는 처음에는 소나무를 제주에 판매하려고 배에 탔다가 태풍을 만나 강소성 동대현에 도착했다. 청나라에서는 그에게 식량과 옷가지를 제공해주고, 귀국경비까지 주었다. 청나라에서 난민에게 지불하는 대가가 후하자, 고한록은 거짓 표류로 돈을 벌고자 의도적으로 표류를 하기 시작했다. 결국 조선에서는 외국과의 교류에 문제를 일으키는 위장 표류인인 고한록의 목을 베어 죽여 버렸다. 1611년 제주 목사 이기빈과 제주 판관 문희현 등은 반대로 일처리를 한 적이 있었다. 이 해에 안남국(베트남) 왕자가 타고 있던 상선이 제주에 표착했다. 이기빈 등은 그들의 배에 실린 재물을 탐내, 안남국 왕자 일행을 모두 죽였다. 이들의 범죄는 곧 발각되어 유배라는 벌을 받았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제주도 사람들은 외국에 나갈 때에 곤경에 처하기도 했다. 1770년 장한철은 일행 29명과 함께 제주도에서 배를 탔다가 표류했다. 다행히 안남에서 일본으로 가는 상선을 만나 구조되었다. 안남 상선이 한라산이 바라보이는 지점에 이르자, 장한철 일행은 환호를 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이들이 제주사람임이 밝혀지자, 안남 왕자를 살해한 사건에 앙심을 품고 있던 안남 사람들이 이들을 바다 한 가운데에 버리는 일이 발생했다. 장한철 일행은 또 다시 표류를 하게 되어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처럼 외국인에게 잘못한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 뒷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기도 했다. |
|

베트남 하롱베이의 어선. 안남국이라 불린 베트남은 17세기에 이미 중국, 일본, 서양인들이 왕래하는 거대한 국제시장을 갖추고 활발한 무역활동을 했었다. 조선 사람들도 이곳에 표류해 온 바가 있었다. |
조선인이 안남 왕자를 죽인 것에 비해, 안남국은 조선인 표류민에 대해 호의를 베풀었다. 1687년 제주를 출발한 김태황(金泰璜)과 일행 24명은 표류를 당해 안남의 회안부(호이안)이란 곳에 표착했다. 이들은 안남국에서 제공해주는 숙소와 쌀과 돈을 받아서 6개월 정도 살았다. 안남국의 왕은 안남국을 방문한 청나라 상인에게 부탁해 김태황 일행을 조선으로 돌려보냈다. 이 때에 왕은 청나라 사람들에게 수고비를 주었고, 조선과 교류할 생각으로 문서도 보냈다. 또한 만약 청나라 상인이 조선에서 답장을 받아서 안남으로 되돌아오면 큰 보답을 해주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청나라 배가 제주에 도착하자, 조선에서는 이를 표류한 것으로 취급하고 청나라 사람을 한양을 거쳐 청나라 수도 북경으로 돌려보냈다. 안남국왕의 호의와 청나라 상인의 성의도 무시하고, 오직 과거 사례에 따라 일을 처리해 버린 것이다.
안남과 조선이 외국인을 대하는 태도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다. 17세기 말 안남은 이미 중국, 일본을 비롯해 포르투갈 등 유럽의 여러 나라와 교류를 했기 때문에, 자기 나라를 찾아온 외국인을 어떻게 대할지를 잘 알고 있었지만, 조선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조선과 안남과의 교류는 계속될 수가 없었다. 세상을 향한 열린 길, 표류 
오늘날과 같이 조선술과 항해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과거에 표류는 다른 나라의 이국적인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였다. 일찍부터 활발한 해상활동을 펼쳤던 우리 조상들에게 표류는 어쩔 수 없는 상처였지만, 이로 인해 새살이 돋는 순기능의 역할도 많았다.
명-청을 제외하면 외국에 대한 정보를 거의 얻지 못했던 조선에 표류민의 경험담은 새로운 자극이었지만, 이를 적극 활용하지 못했던 것이 조선의 한계였다. 네덜란드는 하멜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조선과 직접 교역하기 위해 준비를 하기도 했었고, 안남국은 바다를 통해 조선과 국교를 맺기를 원하였다. 하지만 조선은 낯선 외국인을 원숭이 보듯 했다. 표류가 세계를 향해 열린 길이었음에도, 표류민의 경험을 적극 활용하지 못했던 것은 조선 역사의 아쉬움이었다. 참고문헌: 김영원 외 저, [항해와 표류의 역사], 솔, 2003;핸드릭 하멜 저, 김태진 옮김, [하멜표류기], 서해문집, 2003;최부 저, 서인범·주성지 옮김, [표해록], 한길사, 2004;장한철 저, 정병욱 옮김, [표해록], 범우사, 1979;서미경 저, [홍어 장수 문순득, 조선을 깨우다], 북스토리, 2010;조흥국 저, <한국과 동남아의 문화적 교류>, [실크로드와 한국문화], 소나무, 2000;전영섭, <10〜13세기 표류민 송환체계를 통해 본 동아시아 교통권의 구조와 특성>, [석당논총] 50집, 2011;정민, <표류선, 청하지 않은 손님>, [한국한문학연구] 43집, 2009;유서풍, <근세동아해역의 위장표류사건>, [동아시아문화연구] 25집, 2009;김용만, [지도로 보는 우리바다의 역사], 살림, 2010 |
|
 영등할매 영등할매
해안지방에서 섬기는 바람을 관장하는 신. 음력 2월 초하룻날인 영등날에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알려져있다.
- 글 김용만 / 우리역사문화연구소장
글쓴이 김용만은 고구려를 중심으로 한국 고대사를 연구하고 있다. 현재는 삼국시대 생활사 관련 저술을 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한국고대문명사를 집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고구려의 그 많던 수레는 다 어디로 갔을까], [세상을 바꾼 수레], [새로 쓰는 연개소문전], [광개토태왕의 위대한 길] 등의 책을 썼다.
출처 : http://www.claimcare.co.kr/bbs/sub0503/136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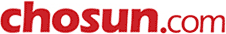
중세 유럽이 그린 세계지도… 아시아 동쪽 끝엔 ‘에덴동산’[주경철의 히스토리아 노바] [86] 기독교 세계관의 지도 ‘마파 문디’ 입력 2023.03.07. 03:00업데이트 2023.03.07. 06:44 중세 유럽의 세계지도(마파문디·Mappa Mundi)는 기독교적 시각에서 세계를 파악하여 그렸다. 단순히 객관적 지리 정보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자체가 하느님의 뜻이 구현되는 무대라는 의미다.(86화 참조) 그렇지만 언제까지 이런 꿈 같은 세계상을 고집할 수는 없다. 대항해시대의 서막이 열리던 15세기 중엽이 되면 새로운 세계 인식을 담아내는 혁신적인 지도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베네치아의 수사 프라 마우로(Fra Mauro)가 제작한 지도가 대표적이다. 출처 : https://www.chosun.com/newsq/2023/02/16/QJCTFLABBZAHNFHZICCTBJQUCM/
동서양이 합작한 국수 그 진한 역사를 후루룩[아무튼, 주말]
[박정배의 아시아 면식여행] 베트남 쌀국수 발상지 하노이 입력 2024.03.09. 03:00업데이트 2024.03.09. 12:22 특히 남딘의 반꾸(Van Cu) 마을 주민들은 쌀농사철이 아닐 때 마을을 떠나 주변 도시에서 노점상으로 일했다. 이들은 소 사골 국물에 쌀국수와 쪽파·허브·물소 고기 등을 넣은, 오늘날 퍼의 원조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 팔았다. 이들이 파는 쌀국수는 주로 베트남 북부 대도시 노동자들이 소비하면서 대중화됐다. 특히 수도 하노이에서 대량 소비됐고, 퍼는 차츰 하노이 음식으로 자리매김했다. 오늘날 퍼의 상업적 발상지가 하노이로 여겨지는 까닭이다.
[아무튼, 주말]
프랑스 기원설 vs. 중국 기원설 입력 2024.03.09. 03:00업데이트 2024.03.12. 15:28 퍼는 식민지 시절 프랑스 식문화 영향을 받아 탄생했다는 ‘프랑스 기원설’과 북부에서 국경을 맞댄 중국 식문화를 받아들여 만들어졌다는 ‘중국 기원설’이 있다. 베트남 사람들이 두 요리 대국의 영향을 동시에 받아들여 재창조했다고 보는 게 합당할 듯하다.
|
|



 표류의 역사, 제주
표류의 역사, 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