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남일보] [우리민족원류.지류를 찾아 .2] 신라이야기 <1>
일제 식민사학자들과 그 후예들은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김부식(金富軾)의 위작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위 문헌사료는 이 지역에서 고조선의 표지유물인 지석묘와 비파형 동검이 출토됨으로써 사실로 입증되었다. 즉 신
라의 선주민들은 고조선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저 머나먼 요동벌판에 살던 고조선 사람들이 기원전 1세기 이전에 어떻게 이 영남 지역까지 내려와서 살게 되었는지는 역사적 상상력과 흥미를 자아내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고조선 사람들이 이 지역까지 남하하게 된
까닭을 추적하다보면 중국 사료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기록들을 접하게 된다.
신라초기 왕위계승의 수수께끼 신라의 초기 왕실은 다른 나라의 왕실과 아주 다르다.
동서고금을 막론 하고 모든 왕실은 일개 성씨가 왕위를 계승하지만 신라 왕실은 박씨·석씨 ·김씨의 세 성씨가 교대로 왕위에 올랐다.
시조 혁거세부터 3대 유리 이 사금(尼斯今)까지는 박씨였으나 4대 탈해 이사금은 석씨였다.
5대 파사 이사 금부터 다시 박씨가 왕위에 올라 8대 아달라 이사금까지 계속 되다가 9대 벌휴 이사금대에 오면 다시 석씨가 왕이 되어 12대 점해 이사금까지 계속된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신라를 공격하는 낙랑(樂浪)에 관한 기사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 기록들은 지금껏 많은 의문을 던져주었다. 한사군의 하 나인 북방의 낙랑이 남방의 신라와 싸운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 이다.
그러나 삼국사기 ‘신라본기’ 시조 혁거세왕 30년(C 28년), 2대 남해 왕 1년(C 4년), 3대 유리왕 13년(AD 36년)조에 잇따라 등장하는 낙랑은 이치에 맞든 맞지 않든 신라와 관계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혁거세왕 때의 ‘낙랑인(樂浪人)’들은 “신라가 도(道) 있는 나라”라는 사실을 알고 부끄러워 그냥 돌아갔고, 남해왕 때에도 시조의 국상(國喪) 중에 금성을 여러 겹 에워싼 ‘낙랑군사〔樂浪兵〕’는 그냥 돌아갔다. 그러 나 유리왕 때의 낙랑은 북쪽 변경을 침범해 타산성(朶山城)을 함락시킨다.
[우리 민족원류.지류를 찾아 .5] 신라이야기(4)
기원전 57년에 건국된 신라는 많은 경쟁상대와 싸워야 했다. 5대 파사 이사금이 재위 8년(87) "짐이 덕이 없이 이 나라를 가져 서쪽으로는 백제와 이웃하고 남쪽으로는 가야와 접했다"는 토로가 이런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 비단 백제.가야뿐만 아니라 마한과 낙랑.말갈도 신라와 부대끼는 상대였다. 그중 신라보다 일찍 건국한 마한은 시조 혁거세왕이 먼저 호공(瓠公)을 보내 문안해야 할 정도로 강한 국가였다.
진한정복 기사를 검토해보자. ‘삼국사기’는 물론 ‘삼국유사’에도 내물왕 때 진한을 정복했다는 기록은 없다. 삼국유사에는 박제상과 관련한 유명한 이야기가 실려 있을 뿐이다. 삼국사기도 마찬가지이다. 삼국사기 ‘내물왕조’의 전쟁 기사는 세 차례인데 재위 9년과 38년, 신라를 침략한 왜병을 물리쳤으며, 40년에는 북쪽 변경을 침략한 말갈을 물리쳤다고 기록 되어 있다. 백제와는 재위 11년과 13년 우호관계를 맺을 정도로 사이가 좋 았다가 18년에는 300여명의 백제인들을 받아들이는 바람에 근초고왕의 항의를 받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화랑세기’의 저자 김대문(金大問)은 화랑을 평하여 “현명한 재상과 어진 신하가 여기에서 솟아나오고 훌륭한 장수와 용감한 병사가 이로 말미 암아 생겼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조금도 과장이 아니어서 삼국통일의 원 동력은 화랑으로 인식되고 있다. ‘화랑 관창’처럼 목숨을 초개처럼 버리고 적진을 향해 돌진하는 청년 무사들이 이룩한 성과가 삼국통일인 것이다. 그러나 화랑의 최초의 대표는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었다
화랑은 그간 귀족 출신 자제들로만 구성된 것으로 인식되어져 왔다. 김 유신은 진골 출신이었고, 김흠운도 왕손(내밀왕(奈密王)의 8세손)이었으며 사 다함이나 관창 또한 귀족출신의 청년 장교들이었다. 그래서 화랑은 귀족신분 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화랑세기’는 귀족의 자제들만 화랑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님을 말해주고 있다. 용춘이 13세(世) 풍월주(風月主) 였을 때 활약했던 대남보(大男甫)가 그런 인물이다.
풍월주(風月主:대표화랑)는대부분 진골출신이 되었지만 8세 풍월주 문노만은 예외였다.그의 아버지는 비조부였고, 어머니는 가야국 문화공주였다.
부계가 가야계였던 김유신은 진골이었으나 문노는 그렇지 못했다.
말하자면 집에 들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가서는 나라에 충성함은 노사구(魯司寇:공자)의 뜻이요, 아무 것도 하는 일 없으되 말없이 교훈을 실천함은 주주사(周柱史:노자)의 종지요, 모든 악행을 하지 않고 모든 선행을 실천함은 축건태자(竺乾太子:석가)의 교화이다.(‘삼국사기’ 진흥왕 37년조)” 유·불·선 삼교 중에서 영향력이 가장 미약했던 유교가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최치원이 당나라에 유학해 유교정치체제를 배웠다는 점과 ‘삼국사기’의 편찬자 김부식 역시 유학자였다는 점과 관련이 있을 것인데, 실상 화랑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상은 선교(仙敎)였다.
김알지가 어디에서 왔을까 하는 것이 수수께끼의 핵심인데, 필자는 연재 초기 신라 시조 박혁거세가 몽골에서 왔다는 견해와 흉노에서 왔다는 견해를 소개한 적이 있다. 문정창씨는 ‘가야사(1978)’에서 경주 김씨의 시조도 흉노에서 왔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비상한 관심을 끌어왔다. 이 주장 의 문헌적 근거는 중국 정사인 ‘한서(漢書)’인데, 이 책에 기록된 경주 김씨의 시조가 김일제(金日?)이다. 김일제는 ‘한서’에 스쳐 지나가듯이 언 급되는 엑스트라가 아니라 ‘한서’ 제 68권이 ‘김일제전’일 정도로 자세 히 언급된 중요인물이었다.
‘한서-김일제전’은 “김당의 어머니는 남인데, 곧 망의 어머니이다〔當 母南 卽莽母〕”라는 주목할 만한 기사가 있다.
이 기사에 따르면 김당과 왕망은 동복형제가 된다.
이 때문에 왕망의 성이 김씨라는 주장이 있게 된 다.
그런데 ‘한서’ 권 98 ‘원후전(元后傳)’은 “효원황후(원제의 비)는 왕망의 고모이다〔孝元皇后 莽姑也〕”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가야사’를 쓴 문정창씨는 ‘한서’의 편저자 반고(班固)가 왕망과 효원황후가 흉노의 후 예임을 감추기 위해 두 사람의 출자(出自)와 그 계보를 달리 꾸며 놓았다 고 주장했다.
김씨로 왕위에 오른 최초의 인물은 신라 13대 임금 미추왕이다. ‘삼국 유사’의 ‘미추왕과 죽엽군(竹葉軍)조’는 “미추왕은 김알지의 7대손”이라고 그 계보를 적고 있다. ‘삼국사기’의 ‘미추이사금조’는 보다 구체적인데 , “미추의 선조는 알지로 계림에서 나온 이니 탈해왕이 데려다가 궁중에서 길러내어 뒤에 대보(大輔)란 벼슬을 주었다. 알지는 세한(勢漢)을 낳고 세 한은 아도를 낳고, 아도는 수류를 낳고, 수류는 욱보를 낳고, 욱보는 구도 를 낳으니, 구도는 곧 미추의 아버지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알 지가 낳았다는 세한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문무왕 비문의 성한왕과 관련 된 논란이다.
황남대총의 주인공에 대해서 제17대 내물왕으로 보는 설이 있다.
북분에서 출토된 굵은고리 금귀걸이가 4세기 말 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고구려 집안 마선구 1호분 출토 귀걸이와 같은 형식이라는 것이 근거의 하나였다.
이는 황남대총의 피장자가 고구려와 가까웠던 임금임을 말해주는데 5세기 무렵 고구려와 밀접했던 신라의 국왕은 제17대 내물왕과 제18대 실성왕(재위 402~417), 제19대 눌지왕(재위 417~458) 등 3대에 걸친 임금들이었으므로 이들 중 한 명이 황남대총의 주인공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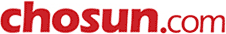
[뉴스 속의 한국사]
[뉴스 속의 한국사] 선덕여왕 때 만들어진 첨성대, 지진에도 끄떡 없었죠
첨성대첨성대를 선덕여왕 때 만들었다는 기록은 '삼국유사'에 보입니다. '시왕대연석축첨성대(是王代鍊石築瞻星臺)', '이 왕(선덕여왕) 때 돌을 다듬어 첨성대를 쌓았다'는 거예요. 15세기의 기록인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633년이라는 건립 연도가 기록돼 있습니다. 첨성대란 명칭은 '별을 관찰하는 건축물'이란 뜻이니 이름에서부터 그 용도가 명백한 셈이죠. 경주의 다른 유산과는 달리 건립 당시의 일화가 전해지지 않은 게 아쉽습니다.


